처음 ‘가족독서릴레이’의 과제가 주어지고 나서는 정말 막막했다. 귀찮은 과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교수님은 가족과 하는 것을 고수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독서릴레이’이지 않은가. 독후감이나 서평보다는 에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거 같은 이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은 지난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책을 고르는 읽은 어렵지 않았다.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기에 바로 그 책으로 정했다. 그다음이 문제였다. 나를 제외한 첫 주자를 정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추석날 집에 가는 길이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동생은 군대에 있고 부탁할 사람이라고는 엄마, 아빠인데 내가 아는 우리 엄마, 아빠는 꼭 읽어야 하냐며 손사래를 칠 게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대학생이 무슨 그런 과제를 하냐”라며 단박에 거절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손도손 모여서 친지들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는 절망했다. 그런 나를 지켜보던 사촌 언니는 마치 천사처럼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흔쾌히 읽어주겠다며 책을 가져간 언니는 그 속도만큼이나 책을 읽고 소감을 말해주는 것도 빨랐다. 너무 빨리 주는 바람에 약간 걱정했었다.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한 것은 아닌지, 언니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의심을 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언니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나의 과제에 동참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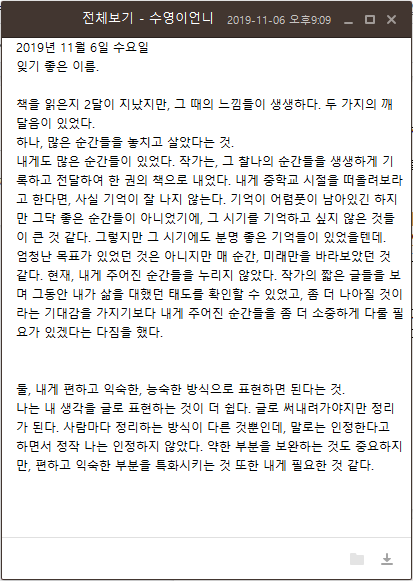
언니는 많은 순간들을 놓치고 살았고 내게 편하고 익숙한, 능숙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1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다지 좋은 순간들이 아니었기에, 그 시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큰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도 분명 좋은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2 나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쉽다. 글로 써 내려가야지만 정리가 된다.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인데,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하고 익숙한 부분을 특화 시키는 것 또한 내게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사촌 언니, 오빠들 모두와 친하다. 우리는 메신저 단체 방도 만들어서 자주 연락하고 명절 때면 꼭 만난다. 그렇게 친하고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이렇게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일은 처음이다. 묘한 기분이 들었달까. 진짜 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언니의 기억 속의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을까.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나는 사촌 언니, 오빠들 모두와 친하다. 우리는 메신저 단체 방도 만들어서 자주 연락하고 명절 때면 꼭 만난다. 그렇게 친하고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이렇게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일은 처음이다. 묘한 기분이 들었달까. 진짜 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언니의 기억 속의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을까.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언니랑은 4살 차이가 난다. 어릴 적에는 옆집에 살았고 지금까지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다. 그렇게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집이 가까워서 종종 언니 집에 가서 밥도 먹고 20살이 넘어서는 술 한 잔 기울이는 친구 사이로 지내기도 했다. 내가 제주도로 오면서는 명절에만 가끔 보는 사이가 되긴 했지만 언니는 늘 반가운 얼굴을 나를 맞아주었다. 책을 읽는 것도, 그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도 귀찮았을 텐데 직접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 글을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다음 계획대로라면, 릴레이의 두 번째 주자는 우리 엄마다. 아빠나 동생은 진작 포기했고 그나마 엄마는 해줄 거 같아서 추석 이후로 안부전화를 할 때마다 계속 말을 했었다. 사실 우리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엄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는 있을까 걱정도 되고 못 읽어도 뭐라 할 말은 없었다. 올해부터 식당을 개업해서 한창 바쁘게 일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식당을 하고 지금까지도 나는 제주도에 있다는 이유로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잘 찾아가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있다. 책을 읽어달라 말하면서도 미안했다. 추석이 한 달 정도 지났을 즘 집에 올라갈 일이 있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다. 아침 일찍 집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곧장 엄마 가게로 향했다.
배가 고픈 나에게 엄마는 한상 가득 차려주었다. 아무리 조금만 달라고 해도 엄마는 늘 정량보다 많게 준다. 나는 남기지 않으려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다 먹는다. 오랜만에 먹는 엄마가 해주는 밥은 정량보다 많이 주는 한상차림처럼 당신의 사랑이 느껴져 참 따뜻했다. 밥을 먹고 잠깐 가게 일을 도왔다. 테이블을 치우고 음식을 서빙하고 설거지도 했다. 아마 그날 처음으로 엄마 일을 도왔던 것 같다.
나는 엄마에게 “엄마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러다 내가 죽겠다"였다. 생각지 못한 대답에 나는 적잖이 당황을 했다. 안부를 물을 때면 엄마는 바빠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가게에서 밤을 지새웠다. 당신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고 나를 먼저 걱정했었다.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나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을 놓치며 엄마의 이름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마는 어떤 이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우리 엄마는 책을 읽지 못했고, 나의 가족독서릴레이는 사촌 언니 한 명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릴레이를 하며, 자신을 지나간 이름과 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책을 썼다는 저자처럼 언젠가 쓸지도 모를 내 산문집에 실릴 이름 하나를 추가하였다. 생의 순간에서 나를 지나간, 내가 지나간, 내가 지나갈 이름들은 몇이나 될까. 나도 그 이름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

< 2019출판문화실습 / 언론홍보학과 4학년 박지연>

